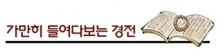
코살라국과 마가다국 사이에 자리한 다끼나기리라는 고장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곳에는 넓은 논밭을 경작하는 바라문 까씨 바라드와자가 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이른 아침, 바라문은 밭농사를 지으러 모여든 농부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도 빈 발우를 들고 그곳으로 가서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씩 음식을 나눠주던 바라문 바라드와자가 부처님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행자여,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먹습니다. 당신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리십시오. 그런 뒤에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일을 한 사람에게 밥을 먹을 권리가 있지요. 그래서 모두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며 삽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 빈 발우를 들고 탁발에 나선 부처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충격입니다.
빈 밥그릇을 들고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밥을 빌어먹는 탁발은 부처님을 비롯하여 모든 스님들이 하루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는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세속 마을로 탁발을 나가면서 자기 수행을 점검하거나 마을 사람을 만나 교화하기도 했기 때문에 탁발은 수행과 포교에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속 사람들은 누
군가를 비난할 때에 “밥그릇을 들고 다니며 동냥이나 다녀라”라는 말로 모욕을 주었다는 기록이 ‘쌍윳따 니까야’에 들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을 들려주시면서 ‘탁발이란 생계 가운데서도 최악’인데 그대들은 자발적으로 그 길을 선택했으니 조금도 헛되이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탁발하려고 한쪽에 서 있는 부처님을 향해 “당신도 땀 흘려 일한 뒤에 밥을 먹으시오”라고 바라문이 말을 했습니다.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괜히 내가 민망해지고 부끄러워집니다. 부처님은 어땠을까요?
“바라문이여,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밥을 먹습니다.”
모욕을 당해 민망하거나 불쾌한 기색 하나 없이 부처님은 담담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대답이 영 사실과 다릅니다. 부처님은 농사를 짓거나 땀 흘리며 노동을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라문 바라드와자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되묻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고요? 그렇다면 말해보시오. 자, 밭이 어디 있습니까? 씨앗은, 쟁기나 호미는, 밭가는 황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그대가 밭을 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태연하게 자신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부처님은 그의 물음이 떨어지기 무섭게 대답합니다.
“믿음이 씨앗입니다. 계를 잘 지키는 것(계행)이 비입니다. 지혜가 멍에와 쟁기입니다. 부끄러움(hiri, 懺)이 쟁기자루요, 뜻(mano)이 쟁기를 자루에 묶는 끈입니다. 마음챙김(sati)이 나에게는 쟁깃날과 몰이막대여서 몸을 단속하고 말을 단속하고 음식의 알맞은 양을 단속합니다. 진리는 잡초를 자르는 낫이며, 평화로움이 내게는 구원입니다. 정진이 내게는 황소이니, 나를 평온함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 황소가 나를 슬픔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되돌아오지 않게 합니다. 이렇게 밭을 갈아서 불사(不死)의 열매를 얻으며, 이렇게 밭을 갈아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부처님의 대답이 끝났습니다. 이 대답은 시(게송)의 형식으로 저 유명한 ‘숫따니빠따’에 실려 있습니다.
수행자는 수행을 하는 사람이지 노동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당시 인도 사회의 분위기가 그랬고, 초기 불교 승가 역시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노동을 한다면 굳이 출가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재가자로서 살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으로도 충분했을 테니까요. 단, 노동에서 풀려난 출가수행자는 그만큼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것도 지니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지요. 그런 까닭에 다른 이가 남긴 음식을 얻어먹어도 행복했고, 빈 발우를 들고 마을로 들어가 남은 음식을 빌어도 떳떳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 재가자와 돈을 벌지 않는 출가수행자의 삶의 방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재가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풍요롭고 부유하게 살면 되는 것이고, 출가수행자는 무소유의 방식을 취하면서 열심히 수행정진하는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남의 밥이나 축내는 존재라고 비웃던 바라문은 부처님의 이 시를 듣자 크게 감동했지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커다란 그릇에 우유로 끓인 죽을 가득 담아 공손히 부처님에게 올리면서 말했습니다.
“존자께서는 이 음식을 드십시오. 불사의 열매를 얻기 위해 밭을 가는 존자야말로 진정으로 밭을 가는 분입니다.”
부처님이 그 우유죽을 받으려고 발우를 내미실까요? 뜻밖에도 부처님은 거절합니다.
“나는 시를 읊은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무엇인가에 대한 대가로서 음식을 받는 일은 내게 맞지 않습니다. 바르게 보는 자에게 그런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치에 맞는 행위입니다.”
‘숫따니빠따’에 실린 대로 따라 읽어가다 이 대목에 이르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한 대가로 돈을 벌어 그 돈으로 양식을 삽니다. 죽을 때까지 노동의 대가로 밥벌이해서 먹고 사는 일을 멈추지 못하는 우리들 보통 사람의 삶과 너무나도 대비되는 부처님의 대답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소설가 김훈도 에세이 <밥벌이의 지겨움>에서 탄식하고 있지요. “죽는 날까지 때가 되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밥이라 정의하면서, 사는 게 버거워서 전날 폭음을 하고 숙취에 시달리면서도 “다시 거리로 나아가기 위해 김나는 밥을 마주하고” 살아가야 하는 서글픔을 토로합니다. 밥벌이 하느라 마신 술에 속이 쓰려서 지금 이 밥을 넘기기 힘들고, 그럼에도 이 밥을 넘기고서 다음에 먹을 밥을 벌어야 하니 이렇게 ‘대책 없는’ 일도 없다고 탄식합니다. 먹고 사는 일이 거룩하지도, 구차하지도 않고 지겹다는 이 탄식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삶을 이렇게 통렬하게 잘 그려냈는지 그저 감탄만 할 뿐입니다.
지혜 제일 사리불 존자의 옛 친구 다난자니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오래 전 다난자니에게 선업을 짓고 살기를 간곡하게 당부한 뒤 헤어진 사리불 존자는 문득 친구가 궁금했습니다.
‘잘 살고 있을까? 악업은 멈추고 선업을 지으며 살고 있겠지?’
하지만 들려온 소문은 정반대였습니다. 권력을 빙자하고 남을 속이고 압박하며 재산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리불 존자는 친구가 사는 마을로 갔습니다. 이른 아침에 탁발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옛 친구 다난자니의 집을 찾아가서 자신이 들은 소문이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이러했지요.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먹고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지요. 부모님을 모셔야하고, 처자식을 부양해야 하고, 하인이며 일가친척도 거느려야 하고, 친구며 손님 접대도 해야 하고, 조상님 제사를 잘 모시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나도 먹고 살아야지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라는 다난자니의 대답은 우리가 늘 하는 말입니다. 그러자 사리불 존자가 되묻습니다.
“부모님 봉양하려니 어쩔 수 없다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식솔들을 거느리려면, 그리고 조상님 제사 모시려면 어쩔 수 없다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러 그 과보로 지옥에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대는 지옥 옥졸에게 지금과 똑같은 핑계를 대겠습니까?”(‘맛지마 니까야’ 다난자니 경)
그건 아니지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핑계는 핑계일 뿐입니다. 아무리 먹고 사는 일이 다급하고 막중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처님과 사리불 존자는 그걸 들려줍니다.
수행은 밥벌이가 아니라고 부처님은 말합니다. 설법이라는 행위도 밥벌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먹고 사는 일은 나를 구차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내가 목표로 삼은 가치를 완수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러니 끼니를 챙기는 행위가 그 가치를 훼손한다면 당당히 밥을 거부하겠노라는 것이 부처님 입장입니다. 세속에 사느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악업이라면 당당히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 사리불 존자의 조언입니다.
고백하자면 속세에 사는 우리는 부처님과 사리불의 입장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느라 용을 쓰고, 먹고 살다 죽고 마는 이 범부의 삶을 한번쯤은 지그시 돌아봐도 괜찮지 않을까요?(계속)
이미령/불교방송 FM 진행자

